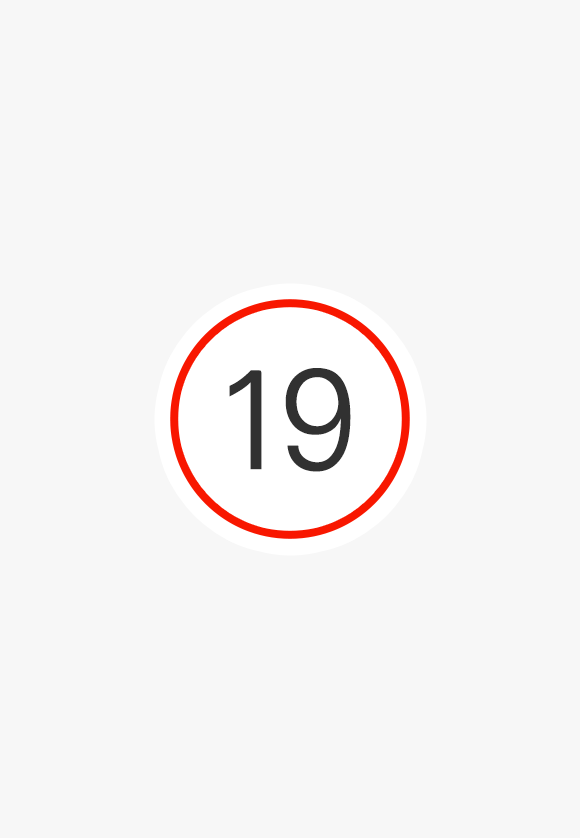
로맨스류 流
 15
15
해궁은 항상 같았다. 해궁의 벽을 밝히고 있는 수정구 외에는 빛이라곤 일절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이 바깥의 시간으로 낮인지 밤인지조차 구분되지 않았다. 그 날 이후로 해신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 적막한 곳에 오로지 여랑과 곳곳을 누비며 돌아다니는 인면어들 뿐이었다. 하지만 여랑이 눈치채지 못했을 뿐, 류는 항상 여랑을 보고 있었다. 자신의 흔적을 지운 채 그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 며칠은 죽은 듯 잠만 자다가 이후 해궁의 곳곳을 둘러본 후 자신의 침소로 돌아와 그렇게 앉아 있었다. 계집은 한곳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렇게 남아 있는 시간을 죽였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자신을 볼 수 없는 계집이지만 그 시선 끝에 서서 마주하며 서있어도 그 생각을 알 수 없었다. 분명 그의 곁으로 데려왔지만, 여전히 자신은 계집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하루의 밤낮이 더 지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잠들지도 않았다. 인간의 식사조차 모두 거부한 채 그 자리에서 굳은 듯 움직이지 않은 계집이 그나마 살아있다는 신호는 오로지 얇은 눈꺼풀이 깜박일 때가 전부였다. 여덟 번째였다. 인면어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여전히 거부한 채 입도 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시선을 못박은채 움직이지 않았다. “……시위라도 하는 것이냐?” 결국 류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아직은 ‘인간’인 계집이 이대로 말라죽길 바라진 않았다. “제 언사에 화가 나신 줄 알았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다. 모습을 감추기 직전의 대화를 떠올렸으나 내색하진 않았다. “너는 내가 진정으로 화를 내는 게 어떤 건 줄 모르는구나.” “오지 않으셔서 혹 제가 있는 곳이 해신의 눈동자 속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류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었다. 그의 그림같은 눈썹이 쓱 위로 올라갔다. 차갑고 음울하고 적막하고 외로운 곳. 그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었다. “저는 아직 해신의 파군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게는 해신께서 말씀하신 인간을 벌할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이어요.” “그렇게도 내 파군이 되고 싶나?” “약조를 지키라 하셨잖아요. 이제는 이행해야 하는 것은 제 쪽이라고.” 이토록 의미없는 대화를 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항상 수경을 통해 종알거리던 계집아이가 이제 말하는 곳은 다른 사내가 아닌 류에게였다. “나의 파군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모르는 모양이군.” “저는 이미 이곳에 왔어요. 그게 제 의무라면 제가 짊어져야 겠죠.” 여랑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류의 손이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 깊게 파묻혔다. 순식간에 끌어당겨 입술이 맞부딪혔다. 아랫입술을 잘근 깨물며 밀고 들어오는 혀가 순식간에 여랑의 입속을 휘저었다. “아……!” “신의 힘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입술을 떼고 여전히 호흡을 주고받는 상태에서 류가 웃음기를 머금고 말했다. 과연 계집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한 사내를 사랑해 그를 위해 삶을 버린 계집이었다. “……언젠가 겪어야 할 일이라면 지금이 낫겠지요.” 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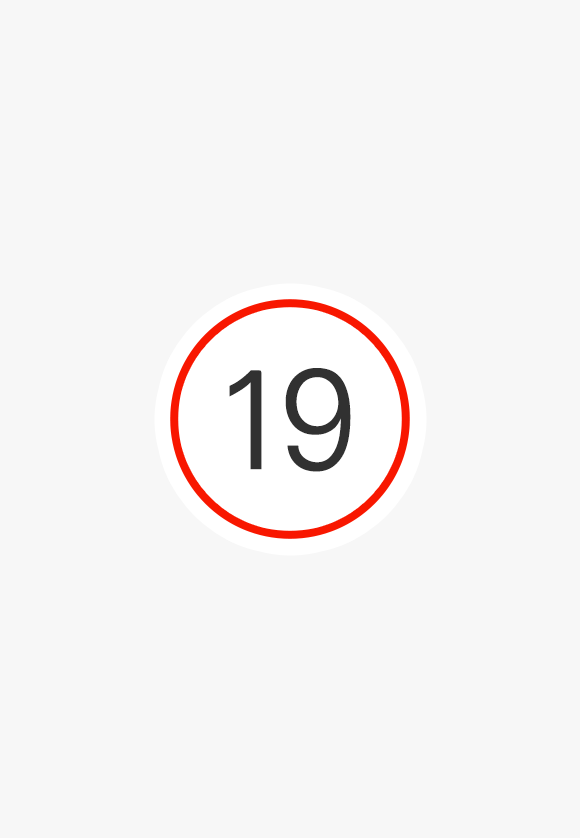
- 한권소장 : 35코인
- 전권소장 : 코인
코인 지불 후 특정 기간동안 작품을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한권 대여 시 3일, 전권대여 시 30일)
코인 지불 후 기간에 상관없이 큐툰 서비스 종료 전까지 언제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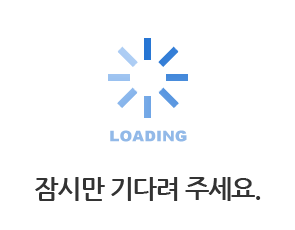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증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증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만화 | 드라마

웹툰 | BL

웹툰 | 무협

웹툰 | BL

웹툰 | 로맨스

웹툰 | 무협

웹툰 | BL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웹툰 | BL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BL

소설 | 로맨스

만화 | TL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소설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만화 | 로맨스

만화 | 드라마

만화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만화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만화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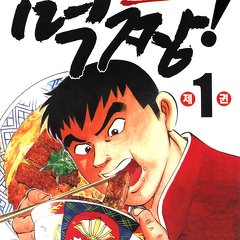
만화 | 드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