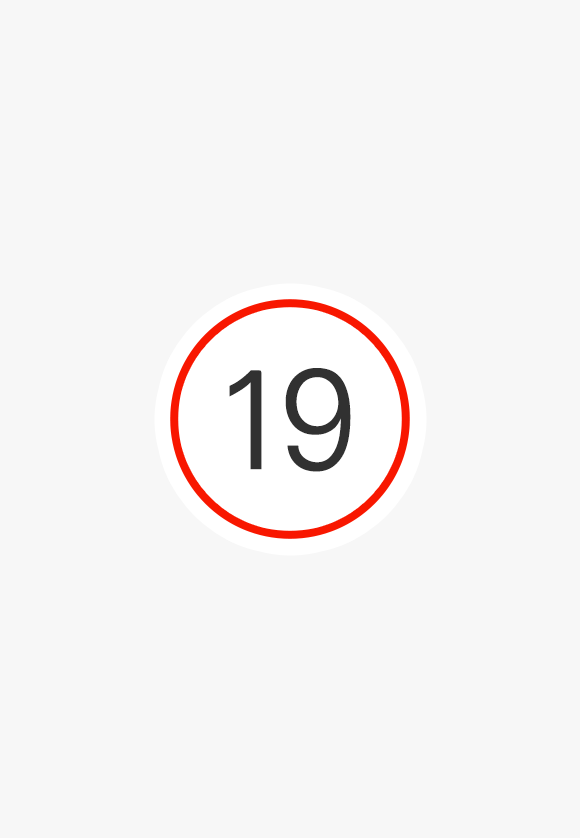
BL만천명월
 703
703
※ 본 작품에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 및 감금, 낙태언급, 관장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품 감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 스승님이 죽었다. 정쟁에 휘말려 누명을 쓰고 살해당했다. 왕세자 륜은 어머니와 스승님의 복수를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한 아버지와 조정을 장악한 조재현에 의해 번번이 실패하고 만다. 마침내 조재현을 실각시킬 꼬리를 잡았으나, 그가 판 함정에 빠져 목숨만 건진 채 기억을 잃고 산골짜기 약초꾼 춘삼에게 구해지는데……. * * * 갑자기 춘삼이 울음을 터트렸다. 턱밑에 쪼글쪼글한 주름이 졌다. 춘삼이 훌쩍이니 바위가 들썩이는 것처럼 보였다. 춘삼은 큰 체구에 비해 소처럼 순한 눈을 지니고 있었다. 동그랗고 검은 눈에서 퐁퐁퐁 눈물이 샘솟았다. 아로는 적잖게 당황했다. 만신창이가 된 것도 나고, 화가 나는 것도 나고, 춘삼 외에 의지할 이도 없는 막연한 인생도 나이거늘 정작 제가 세상을 잃은 듯 서글프게 울었다. 두 손으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온몸을 파르르 떨고 있었다. “내가…… 내가…… 얼마나…… 아로를…… 끅…… 아로를…… 사랑, 사랑……하는데…….” 아로는 정수리까지 솟구친 짜증도 잊고 그 모습을 멍하게 지켜봤다. “내가…… 아로 보려고…… 끅…… 아로를 보려고…… 얼마나…… 매일…… 아로…… 아로…… 생각만 하는데…….” 겉과 속이랄 게 따로 없는 투명한 춘삼에게선 언제나 주체 못한 연정이 선명하게 보였다. 아로가 어찌 모르겠는가. 저를 향한 절대적인 헌신을……. * * * 아니다. 그것은 변명일 뿐이다. 지율은 자기가 륜을 흥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륜을 남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온몸을 비틀며 밤을 구하는 남창은 자신의 것이어야 했다. 륜이 남창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나의 남창’이 아니라는 것이 싫었던 것이다. “아아아……!” 외마디 비명이 질러진 후에야 문란한 마찰음이 멎었다. “하으…….” 색정적 비음이 흘러나왔다. 아로는 만족스러움에 엉덩이를 흔들며 제 뒷구멍을 채운 자지를 조이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후회를 즐기는 천박한 행동이 다시 자지를 발기시킬지도 몰랐다. 지율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 앞에 서 있었다. 뛰쳐나가지도 방에 들어가지도 주저앉을 수도 없었다. 심장은 흉통을 흔들며 거세게 뛰었고 관자놀이를 관통한 듯 지독한 두통에 눈이 충혈 됐다.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의 이름도 이 다음 해야 할 행동도, 아무것도 몰랐다. 지율은 그저 서 있었다. “지율아.” 그때 륜의 목소리가 들렸다. 갈라진 목소리가 지율의 이름을 불렀다. “지율아, 들어오너라.” 륜이 재차 지율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지율은 그의 부름이 낯설었다. “무서워하지 말고 문을 열거라. 내가 있다.” * * * “이 씨물은 언제 싼 씨물일까? 오늘 아침 평상에서 아로를 엎어놓고 위에서 아래로 처박으며 싼 씨물일까? 아니면 저녁에 부뚜막에서 아로를 세워두고 옆으로 박아 싼 씨물일까?” 춘삼은 혓바닥을 길게 빼서 구멍에 맺힌 정액을 빨아 먹었다. 풀처럼 끈적이게 들러붙은 씨물까지 혓바닥에 눌어붙었다. “읏…… 다 섞인 씨물 아니겠느냐?” 춘삼은 아로의 축축이 젖은 구멍을 보다가 그의 몸에 타올랐다. 아로는 제 등에 엎드린 춘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세필을 놓쳤다. 세필이 또르르 구르면서 바닥에 검은 먹 자국이 생겼다. 춘삼이 아로의 머리맡에 손을 짚고는 아로의 몸을 바로 돌렸다. 두 사람은 숨결이 섞일 만큼의 간격을 두고 마주 봤다. “아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라니?” “아니…… 내가, 음…… 잘 모르겠는데,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어떻게 말이냐?” 춘삼은 답을 찾지 못하고 입을 우물거렸다. 아로는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춘삼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난 몰라. 설명을 못 하겠어. 그런데 달라진 것 같아.” “그러냐? 그럼 내가 달라진 게, 좋으냐? 싫으냐?” 춘삼은 고민하는 듯 미간을 좁히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다. “좋……은 것 같아.” “그럼 되지 않았느냐?” “그런가?” “참으로 실없구나.” 춘삼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빙긋이 웃는 아로는 보며 저도 빙긋이 웃었다. “아로, 나 아로 젖꼭지 빨아도 돼?” 아로는 저고리 고름을 풀고 겉섶을 활짝 펼쳤다. “그래, 빨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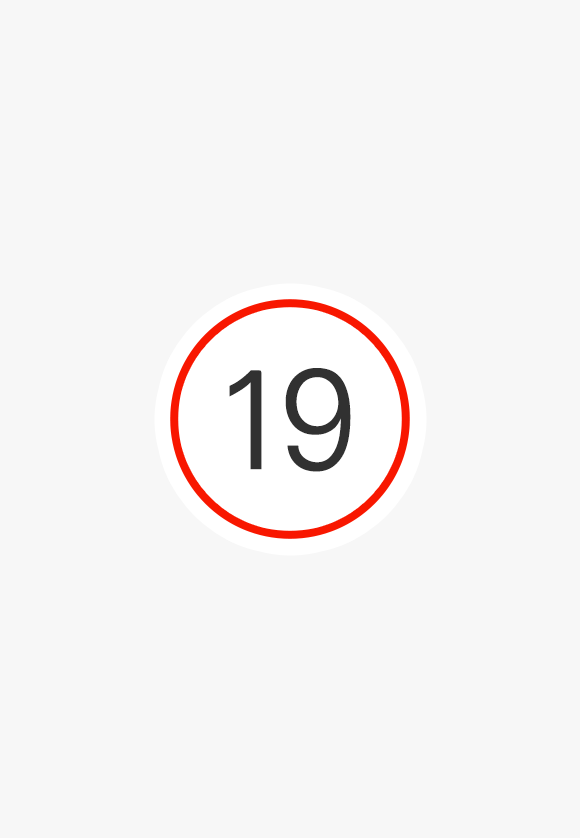
- 한화소장 : 1코인
- 전화소장 : 코인

소설 | BL
오지랖 입니다 야야
소설 | BL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피아니시모
소설 | BL
루트를 거부하는 방법 허니트랩
소설 | BL
달이 비친 눈동자 펜쇼
소설 | BL
오메가 커플 매니저의 고충 목련맛
소설 | BL
개과천선 에르모
소설 | BL
고등학교 대리 출석하러 갑니다 피아A
소설 | BL
나의 전생 보고서 희래
소설 | BL
짝사랑하는 희민이 베티버
소설 | BL
이름의 주인 실크로드
소설 | BL
돌아가는 길 해단
소설 | BL
페로몬 스플래시 카에트
소설 | BL
사슬(鎖) 한조각
소설 | BL
데뷔를 피하는 방법 공수교대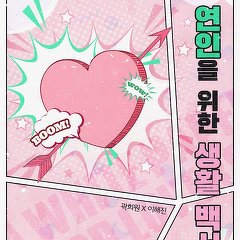
소설 | BL
연인을 위한 생활 백서 영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