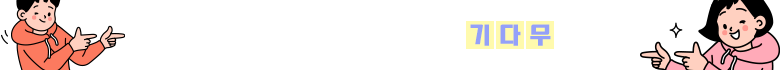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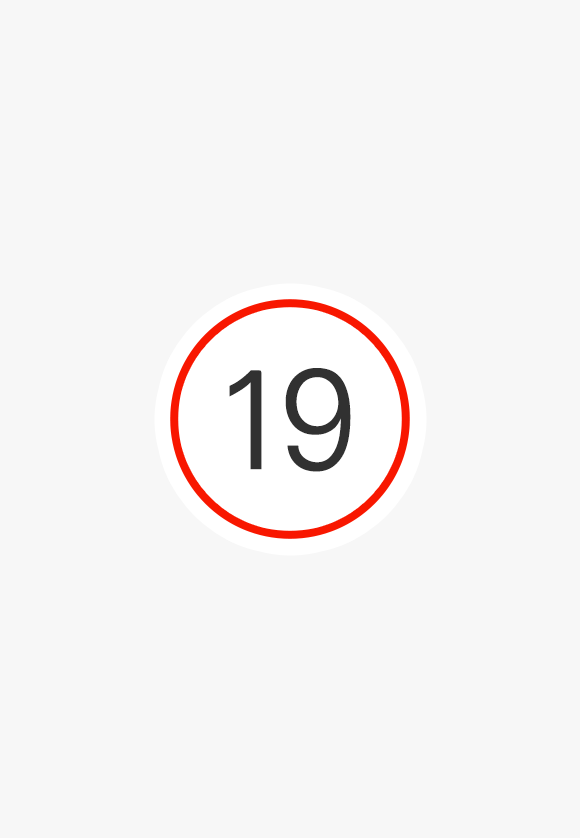
BL봉숙 미용실
 288
288
반복되는 일상과 사람 사이의 무게에 지쳐 있던 한겨울의 어느 날, 한윤서는 스물일곱 해 인생 처음으로 충동적인 여행을 떠난다. 딱 맞아떨어지는 버스 시간, 낯선 이름. 두 가지 이유로 택한 목적지는 양원군이었다. 하지만, 서울 촌놈에게 시골은 냉혹했다. 죄다 꺼진 간판, 오가는 인적 하나 없는 버스 터미널. 되는 일이 하나 없다고 자조하고 있을 때. “어디 가세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순박한 얼굴을 한, 대형견같은 최승권을 만난다. 낯가림이라고는 없는 건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살갑게 구는 최승권. 높이 뻗은 시멘트 빌딩 대신 탁 트인 바다와 낮은 건물들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 한윤서는 저도 모르는 사이, 최승권과 양원군의 따스함에 점차 녹아들어 가는데……. [본문 중에서] 찬란하게 세상을 비추는 햇살을 둘은 한참이나 받아 마셨다. 한겨울 차가운 바닷바람이 코끝을, 온몸을 할퀴고 지나가는데도 그저 따스하기만 했다. “윤서 형.” 홀린 듯 일출을 바라보던 최승권이 돌연 목소리를 내었다. 저를 부르는 소리에 한윤서는 고개를 모로 틀어 최승권을 마주했다. 말간 눈동자 안에 일렁이는 빛과 함께 제가 오롯이 들어찼다. 한참을 빤히 쳐다보아도 최승권은 입술을 안으로 만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형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기 더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최승권이 정적을 깨고 말을 이었다. 맞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마치 자신을 원한다는 것처럼 단단히 얽힌 손에 한윤서의 심장이 이상하게도 빠르게 뛰었다. “……왜?” 입술은 제멋대로 움직여 소리를 빚어냈다. “형이랑 지내는 게 너무 좋아서요.” 망설임이 깃든 물음에 최승권의 볼록하게 솟은 울대뼈가 은은하게 흔들렸다. 말을 마친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훤히 드러난 목덜미가 익은 듯 발그스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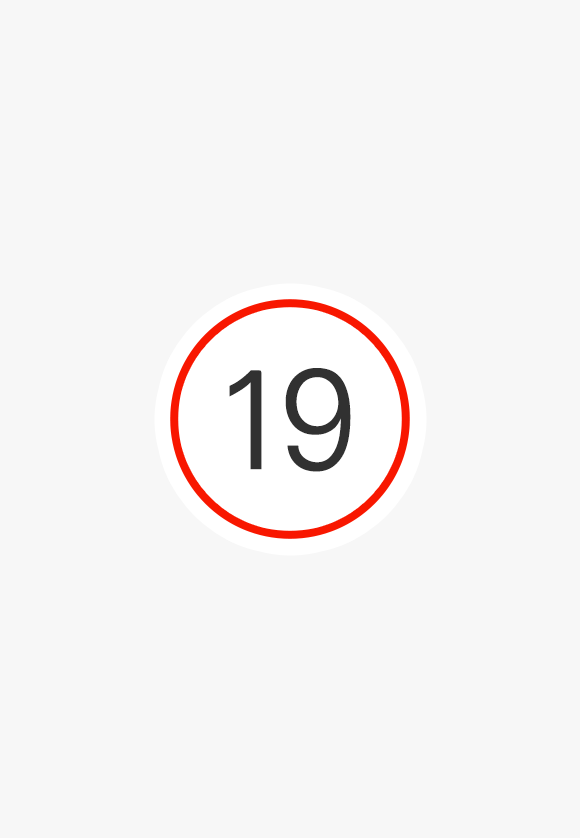
- 한화소장 : 1코인
- 전화소장 : 코인

소설 | BL
오지랖 입니다 야야
소설 | BL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피아니시모
소설 | BL
루트를 거부하는 방법 허니트랩
소설 | BL
달이 비친 눈동자 펜쇼
소설 | BL
오메가 커플 매니저의 고충 목련맛
소설 | BL
개과천선 에르모
소설 | BL
고등학교 대리 출석하러 갑니다 피아A
소설 | BL
나의 전생 보고서 희래
소설 | BL
짝사랑하는 희민이 베티버
소설 | BL
이름의 주인 실크로드
소설 | BL
돌아가는 길 해단
소설 | BL
페로몬 스플래시 카에트
소설 | BL
사슬(鎖) 한조각
소설 | BL
데뷔를 피하는 방법 공수교대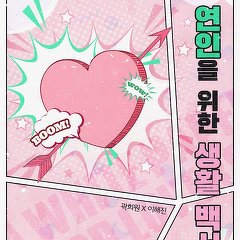
소설 | BL
연인을 위한 생활 백서 영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