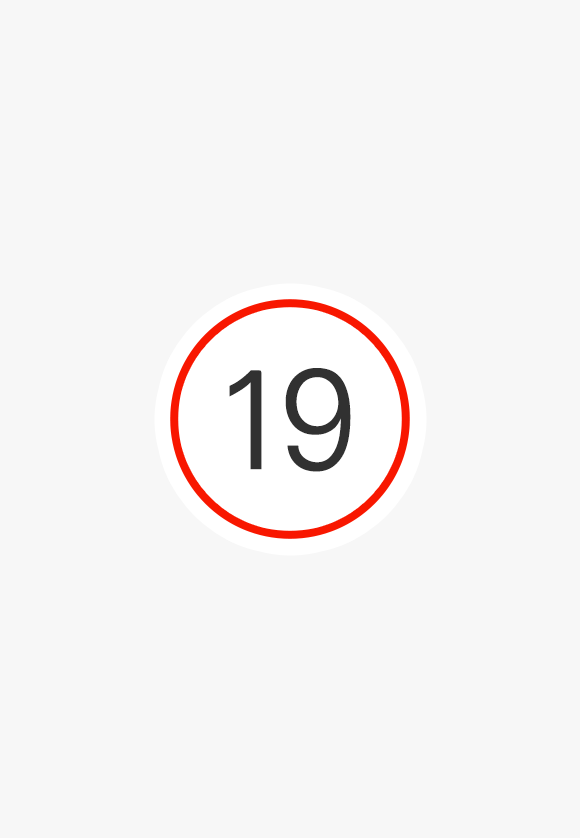
GL피의 맛
 890
890
회사에서 내 이름은 없는 것에 가깝다. “미스 고.” “유미야.” “얘.” 고유하길 바라 부모님이 지어 주신 고유미란 이름은 쪼개지고 쪼개지다 못 해 급기야……. “야.” 라는 족보 없는 이름으로까지 불리우게 된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책상 위에 올라가 사직서를 뿌리는 상상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에 그치는 이유는 혹시나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 그리고……. “유미 사원님.” 절대 나를 낮추어 부르는 법이 없는 나 희주 과장 때문이다. 그녀가 어느 날 나를 불렀다. “회식 갈 거죠?” “저요?” 계약직 사원에게 왜 회식을 같이 가자는 거지? 무슨 꿍꿍이야? 그날 나는 회식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 따라가길 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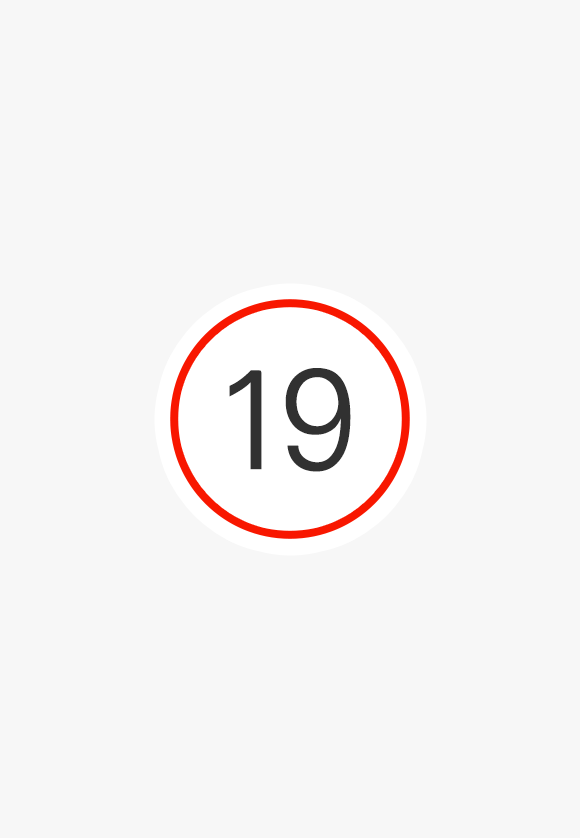
- 한화소장 : 1코인
- 전화소장 : 코인

소설 | GL
아주 보통의 연애 지기
소설 | GL
젖과 꿀 봄쌀
소설 | GL
스폰서($ponsor) Stego
소설 | GL
침잠과 부유 사이 Aktiv
소설 | GL
봄감기 봄쌀
소설 | GL
마가 낀 여자 달그네
소설 | GL
아내가 필요해 정시라
소설 | GL
저기 누구 조장 하실 분? Cloud
소설 | GL
냥냥하네요 노답샵
소설 | GL
이별 프러포즈 투구
소설 | GL
보통의 친구 사이 실레
소설 | GL
계약결혼 : 의처증 Cloud
소설 | GL
스웨터, 블라우스, 그리고 린넨에 대하여 감마
소설 | GL
하얀 꽃 달그네
소설 | GL
빚내는 인생 작은형코인 지불 후 특정 기간동안 작품을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한권 대여 시 3일, 전권대여 시 30일)
코인 지불 후 기간에 상관없이 큐툰 서비스 종료 전까지 언제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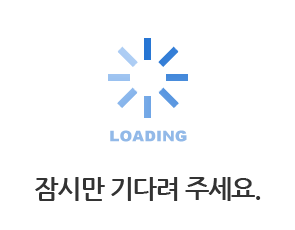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증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증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만화 | 드라마

웹툰 | BL

웹툰 | 무협

웹툰 | BL

웹툰 | 로맨스

웹툰 | 무협

웹툰 | BL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웹툰 | BL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BL

소설 | 로맨스

만화 | TL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소설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BL

웹툰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웹툰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소설 | 로맨스

만화 | 로맨스

만화 | 드라마

만화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만화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만화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웹툰 | 드라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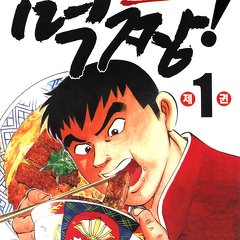
만화 | 드라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