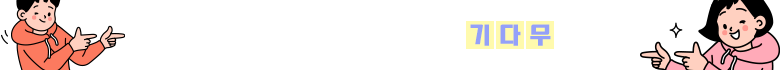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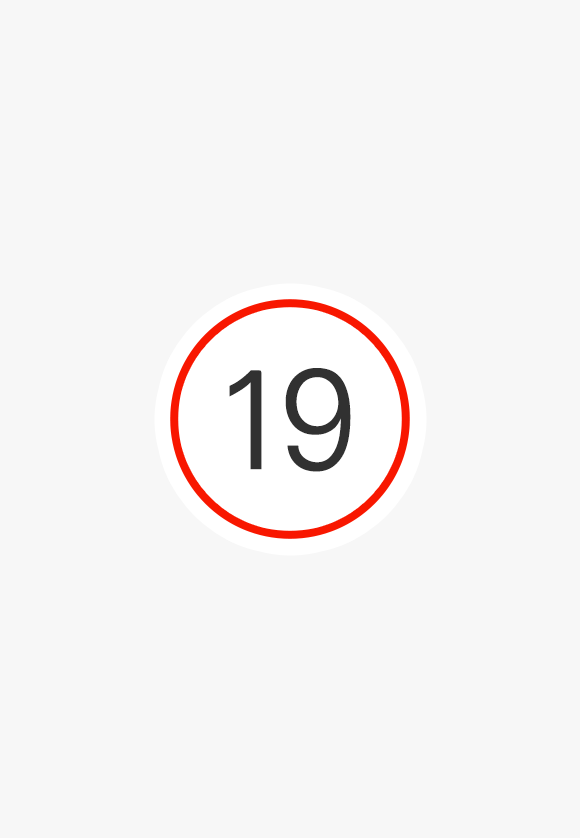
로맨스단 한 사람
 95
95
처음부터 심장이 원했던 단 한 사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이유 때문이었다. 내가 당신의 여자가 되는 것. 당신이 내 남자가 되는 것. 문이 벌컥 열리고 손목이 잡히는 순간 안으로 홱 끌려 들어갔다. “읍.” 등이 꽝, 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혔고 입술이 거칠게 삼켜졌다. 미처 어떻게 할 틈도 없었다. 해진은 놀라서 동그랗게 뜬 눈을 꼭 감았다. 입술을 헤집고 들어온 혀가 거침없이 그녀의 혀를 낚아챘다. 그의 진심을 알고 싶었다. 원하는 게 정말 그녀가 돌아서는 것인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하는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 보리라 단단히 마음을 먹고 들어왔는데 그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목숨 줄처럼 움켜쥔 가방 끈이 끊어질 듯 짓이겨졌다. 어찌나 꽉 움켜잡았는지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다. 그저 손목 하나를 잡혔을 뿐인데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입술로 몰려든 신경들이 우르르 그에게 빨려 들어갔다. 감아 올린 혀를 쭉 빨아들이자 발끝까지 짜릿한 전율이 일었다. 거침없지만 통증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다. 부드러우면서 집요하고 강렬했다. 그는 마치 교묘하게 강약을 조절하는 것처럼 빨아들일 때는 온몸의 신경 줄이 그에게 몽땅 달려갈 정도로 강했고, 어르고 달랠 때는 몸이 노곤해질 정도로 달콤했다. 그의 혀가 안쪽 여린 속살을 꼼꼼히 핥았다. 아랫입술을 잘근잘근 씹다 혀로 부드럽게 핥고 빨아들였다. 가슴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오랜 시간 쌓였던 깊은 그리움들이 몸속에서 반란을 일으키며 들고 일어났다. 얽힌 혀가 더 꽉 조여졌다 풀려났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그가 고개를 그녀의 어깨에 기대며 혼잣말처럼 물었다. 마치 우물거리는 것처럼 들렸다. 맥박이 파닥거리는 곳에 그의 뜨거운 입술과 숨결이 느껴졌다. “기다…… 렸어요?” “간절히.” 아, 간절히. 그 어떤 고백보다 더 설레고 달콤한 단어. 쿵쾅거리던 심장이 숫제 펑하고 터질 것처럼 요동을 쳤다. 그가 고개를 들고 그녀의 볼을 두 손으로 감쌌다. 해진은 감았던 눈을 뜨고 가만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글이글 불타고 있는 검은 눈동자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직 저 문을 나갈 기회는 있어.” 그는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 밀어냈고, 거부했으며 함께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그래놓고 또 기회를 준단다. 선택하라고 한다. 해진은 입술을 겨우 움직여서 부드럽게 웃었다. 선택은 이미 오래 전에 했고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이유였다. 강석문, 당신의 여자가 되는 것. 당신이 내 남자가 되는 것. 살면서 이렇게 집요한 집착이 생길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아침에 깨어나서 잠자는 그 순간까지 그는 늘 그녀와 함께 있었다. 공부를 할 때도 심지어 지독하게 아플 때도 오로지 강석문, 이 남자 생각뿐이었다. 활력소였고 버팀목이었다. 흔들림 없는 그녀의 시선 안으로 회오리가 일었다. 지난 시간들을 모조리 쓸어버린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꿀꺽 삼켜 버린다. 남은 건 지금, 마주보고 있는 이 순간뿐이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아프게 할지도 몰라.” “아파하지 않을게요.” “그만두고 싶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땐 너무 늦고 말 거다. 시작한다면 절대 멈추지 않을 거니까. 힘들고 주저앉는 너라도 결코 놓지 않을 거니까. 모든 걸 철저하게 계산에 넣었다. 다른 남자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는 그녀를 본 순간 머릿속은 빠르게 움직였다.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사라지고 나면 따라 나올 걸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주차장에서 시간을 끌었다.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도 그는 일부러 시선 한번 주지 않았다. 그러나 온 신경은 그녀를 향해 있었다. 누구도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다. 그 누구도. 유해진은 내게 속해 있으니까.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의 일은 그렇게 장담하는 게 아니야.” “장담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확신, 믿음. 사랑은 물이다. 그냥 흐르는 거다. 아무도 왜냐고 묻지 않는다. 산이 거기 있는 것과 같이, 바다가 그곳에 있는 것과 같이 너무나 당연해서 저절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 사랑은 독이다. 약이 될 수도,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독. 모르고 마실 수도 있겠지. 하지만 알고도 마시는 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독이 아닌가. 그녀에게 이 남자는 물이고 독 같은 존재다. 왜냐고 묻지도 않을 거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마실 수밖에 없는 독. 해진은 느릿한 동작으로 넥타이를 풀어내고 그의 목에 두 팔을 둘렀다. 커다란 키의 남자에게 닿기 위해 까치발을 딛고 섰다. 그래도 닿지 않은 거리에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안아줘요.” 꼭꼭 간직하고 있던 사랑이 그를 만난 순간 펑하고 터져 버렸다. 같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안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꿈꾸던 사랑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어쩌면 강석문 이 남자 곁에 남아 있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초조함. 절망감. 그 모든 걸 떨쳐낼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 “…….”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닿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느리게 움직이지 않았다. 폭풍을 그녀의 안에 거침없이 쏟아 넣고 휘저었다. 허리를 바싹 끌어안고 뒷목을 꼼짝도 못하게 단단히 잡아 눌렀다. 해진은 입술을 활짝 열어서 그를 받아들였다. “으읏.” 뒤엉킨 혀를 그가 쭉 빨아들이자 고개가 한껏 뒤로 젖혀졌다. 숨결 하나도 새어나갈 틈이 없었다. 등을 쓰다듬던 손이 블라우스 속을 파고들어 그녀의 탱탱한 가슴을 움켜잡고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희롱을 당하던 가슴 정점이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었다. 석문은 입술을 놓지 않은 채 블라우스를 확 잡아당겼다. 후두둑 단추가 튕겨 나가 바닥 어딘가로 흩어졌다. “널 원해.” 간절히. 그리고 지독하게. 이 욕망의 끝이 파멸이라고 해도 이젠 어쩔 수 없다. 멈추기엔 모든 게 너무 늦었으니까. 석문은 그녀의 몸을 번쩍 안아 올렸다. 착 감기듯 안겨오는 몸을 꼭 끌어안고 방으로 향했다. 침대에 내려놓고 빠르게 옷을 벗어던졌다. 한껏 부풀어 오른 중심으로 그녀의 시선이 닿았다. 그는 거침없고 당당하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후크가 풀어진 브래지어와 여전히 즐겨 입고 있는 청바지를 벗겨냈다. 은밀한 숲 속만 겨우 가린 채 누워 있는 그녀는 아찔할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붉게 달아오른 볼, 타액으로 번질거리는 입술, 흐릿하게 손자국이 묻은 풍만한 가슴, 잘록한 허리, 늘씬한 허벅지가 끝나는 은밀한 그곳. 검은 눈동자 속에 뜨거운 불길이 폭발하듯이 확 솟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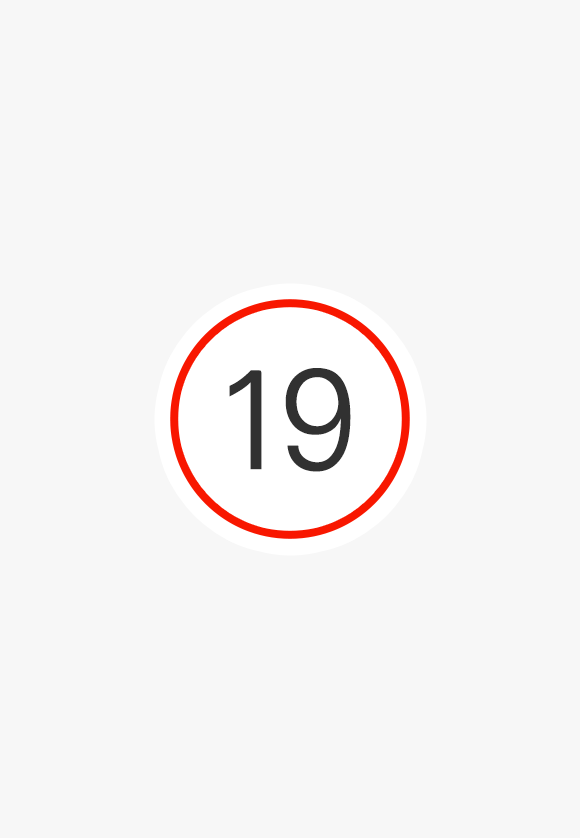
- 한권소장 : 22코인
- 전권소장 : 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