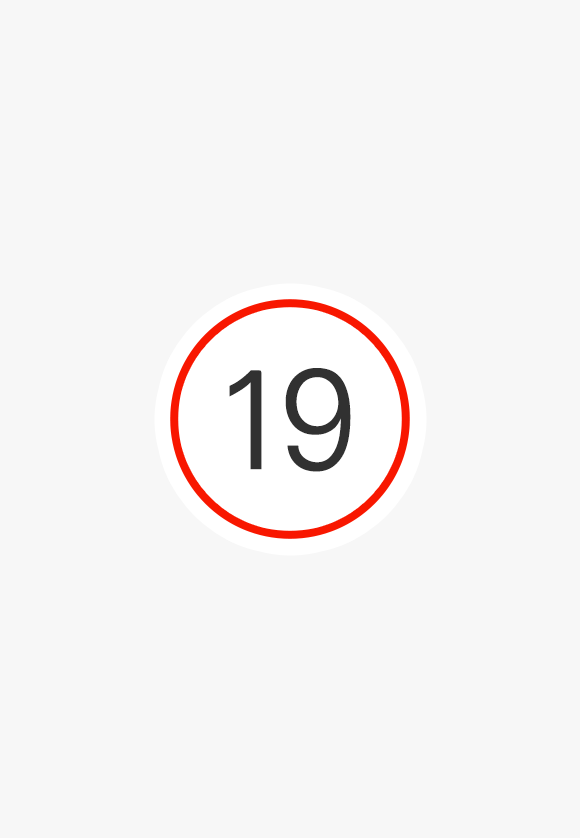
로맨스호랑이를 잡아먹은 토끼
 0
0
병에 걸린 그리아는 토끼 부족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동굴 안에 들어간다. 홀로 죽어 가던 그리아를 발견한 것은 호랑이 사냥꾼 루칸. 루칸은 비몽사몽간인 그리아를 홀라당 먹어 버리는데…. “어떡할 거야! 난 더럽혀졌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의식인가 뭔가 그거 하면 나랑 섹스할 거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를 잡아먹는다…? <<맛보기>> 눈을 떴다. 네모난 구멍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새파랗다. 손을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다. 내 몸이다. 뺨을 만져 본다. 열이 없다. 땀으로 축축하지도 않고 그저 보송보송하다. 몸도 가볍다. 나는 몸을 일으켜 자리에 앉았다. 천막이 아니라, 집이다. 바닥에 나무가 깔려 있고, 천장이 높다. 버려진 나무집에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큰 것은 처음 본다. 천장 한가운데를 통나무가 가로지른다. 어떻게 공중에 달려 있는 거지? 역시 여기는 정령의 땅인 걸까. “일어났냐?” “악!” 정신없이 천장만 올려다보는데 누군가 다가와 옆에 털썩 앉는다. 그것만 해도 놀라 죽을 뻔했는데 얼굴을 보고서는 진짜 할 말을 잊어버렸다. 내 세 배는 될 것 같은 몸집, 울퉁불퉁하고 커다란 근육, 흉터투성이의 진한 갈색 피부, 두꺼운 눈썹, 위아래는 짧고 옆으로만 죽 찢어진 두 눈,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까만 눈동자, 커다랗고 높은 코, 직선을 그리는 콧등, 색이 옅은 입술, 뾰족한 턱, 한가운데가 불뚝 튀어나온 목. 무서워. 나는 겁먹어 그것에게서 눈을 돌리지도 못한 채로 벌벌 떨며 뒤로 기어갔다. 그러다 나를 쳐다보던 두 눈이 찌푸려지자 그 자리에서 얼어 버렸다. 그가 나에게 팔을 뻗어 왔다. 팔이 어찌나 긴지 앉은 채로 상체만 숙여 내 팔을 덥석 붙잡는다. 거대한 손에 내 팔뚝이 완전히 쥐어진다. 힘이 엄청 세다. 나는 날 그러쥔 무지막지한 손아귀 힘에 경악해서 뿌리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가 당기는 대로 끌려와 다시 요 위에 앉혀졌다. “여기 앉아 있어.” 이부자리 위에서 벌벌 떠는 날 두고 나가 버린다. 나는 멍하니 그가 나간 문만 바라보다 창밖에서 들리는 이야기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렸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죽은 걸까, 산 걸까? 방금 그건 뭐지? 사람이 맞나? 그러고 보니 이상한 생김새인데 낯이 익다. 갈색 피부, 커다란 몸, 기다란 눈…. 아, 꿈속에서 본 정령이다. 깨달음에 손바닥을 주먹으로 탁 치는데 방금 나갔던 정령이 다시 문 안으로 들어온다. 손에는 그릇을 들고 있다. 곁에 앉아 내 무릎에 그릇을 올리고 숟가락을 들려 준다. 그릇 안에는 회색 죽이 담겨 있다.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이는데, 정령이 말한다. “먹어.” 정령은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두꺼운 소리를 냈다. 들을수록 신기한 목소리다. 마법이 실려 있는지, 꼭 저 말에 따라야 할 것만 같다. 하지만 코뿔소 똥을 물에 갠 것같이 생긴 음식에 도저히 손이 가질 않는다. “먹여 줘?” 차마 입에 넣지를 못하고 있자 정령이 이상한 말을 한다. 무슨 말인지 몰라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자 그릇과 숟가락을 가져가더니 자기 입에 죽을 한 숟갈 넣는다. 저걸 먹다니. 경악해서 그 씹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내 턱을 콱 붙잡는다. 턱에 가해진 충격에 입을 열자 제 입을 갖다 붙이고 제가 씹던 죽을 처넣는다. 죽이 내 입으로 넘어가자 얼굴을 떼고는 턱을 손으로 꾹 밀어 입을 닫아 버린다. 나는 엉겁결에 죽을 삼켜 버렸다. 구역질나게 생겼는데 의외로 고소한 게 꽤 맛있다. 약 냄새는 좀 나지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하는 거야?” 기겁해서 쳐다보자 뚱한 표정으로 입을 연다. “너 끙끙 앓을 때 내가 다 이렇게 먹였어.” “아….” 이 정령이 날 구해 준 건가. 그럼 난 살아난 걸까. 멍하니 있는 사이 정령이 다시 또 죽을 한입 문다. 나는 얼른 그릇과 숟가락을 뺏어 들었지만 이 한입까지는 받아먹어야 했다. 입이 떨어지고 죽을 삼킨 뒤, 일단 나는 먼저 해야 했을 말을 뱉었다. “살려 줘서 고마워….” 정령의 입가에 미소가 걸린다. 하지만 아직은 무서워. 계속 보고 있다간 체할 것 같다. 그릇에 코를 박고 죽에만 집중했다. 속에 음식이 조금 들어가자 허기가 느껴진다. 결국 허겁지겁 싹싹 비웠다. 정령은 내가 죽 먹는 것을 계속 곁에서 지켜봤다. 그릇을 비우자마자 내 손에서 그걸 얼른 빼앗아 간다. 정령은 그릇과 숟가락을 저 옆에 던지듯이 팽개치고 내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 살려 준 건 정말정말 고맙다. 근데 그건 그거고, 너무 무섭게 생겼다고. 쫄아서 고개를 뒤로 빼자 씩 웃는다. 도망갈 새도 없이 순간 입을 부딪친다. 갑자기 웬 뽀뽀?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 입술을 가르고 혀를 비집어 넣는다. 입천장이며 입 안을 살살 핥더니, 혀를 얽어 온다. 뭐지 이건…. 밥 다 먹었는지 확인하려는 걸까…. 정령이 하는 대로 얌전히 있는데, 점점 숨이 막힌다. 이대로 가다간 질식할 것 같아 고개를 돌리려는데 손으로 턱을 꽉 잡아 고정시킨다. 적응이 안 되는 힘이다.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우리 부족에서 제일 힘이 센 루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구속당해 당황한 나머지 정령을 밀쳤다. 당연히 손톱만큼도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아예 한 팔로 허리를 끌어안아 버린다. 놀라 본능적으로 저항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입 안의 움직임이 더 거세진다. 내 침을 꿀꺽꿀꺽 마시는 것 같기도 하고. 혀뿌리가 아리다. 혀가 뽑혀 나갈 것 같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계속 핥아져서 그런지 점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진다. 입술이며 혀며 찌릿찌릿하다. 누군가 머리 가죽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뒤통수가 당긴다. “으응…!” 순간 나도 모르게 이상한 목소리가 나왔다. 목구멍 안쪽, 안 쓰던 곳에서 울리는 소리. 내가 낸 소리에 놀라서 눈을 반짝 뜨는데 정령이 눈앞에서 킥킥 웃는다. “긴장 풀어. 좋은 거 해 줄 테니까.” 눈을 똥그랗게 뜬 나를 이부자리에 눕히고 내 위로 엎드린다. 어쩐지 그 꿈의 연속인 것 같다. 예지몽이었던 걸까. 사제가 아닌 나는 예지몽을 처음 꿔 봤기에 돌이켜 보려 해도 꿈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꿈에서는 뭘 했지? 떠올리려 노력하는데 정령이 내 어깨를 콱 문다. “아!” “딴생각하지 마.” 정령이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기 전 냄새를 맡는 것과 똑같다. 소름이 끼친다. 나는 손을 꼭 마주 잡았다. 손이 조금 떨려 온다. 정령이 목에 입을 맞춘다. 어쩐지 뽀뽀를 하는 모양새지만 이런 곳에 뽀뽀라니. 이건 마치… 뽀뽀가 아니라…. “……!” 역시 맛보는 거였나 봐. 혀를 길게 내밀어 내 목을 핥아 올린다. 그러더니 피부를 잘근잘근 깨문다. 나는 기겁해서 몸을 움츠렸다. “나 잡아먹을 거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속삭이듯이 물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정령이 또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는다. 용기를 내 정령을 내려다보는데 그의 얼굴에 장난스런 표정이 가득하다. “응, 먹을 거야.” 나는 침을 꼴깍 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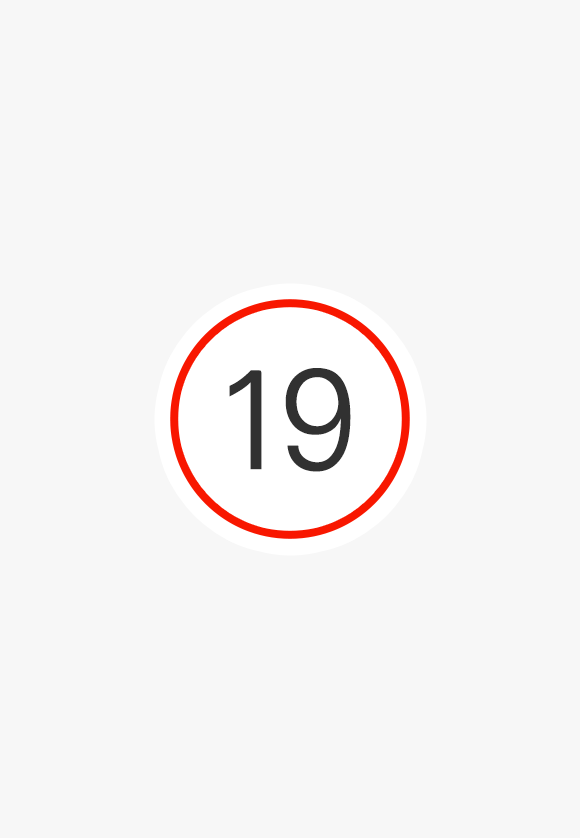
- 한권소장 : 30코인
- 전권소장 : 코인